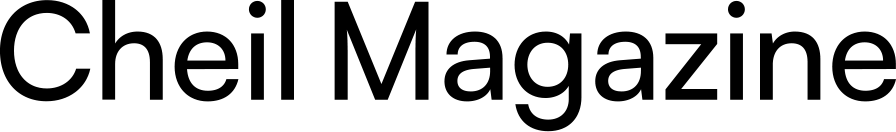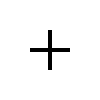김용섭 트렌드 분석가 /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장
당신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 그동안 한국인에게 집은 재산이지 재테크의 수단이었지 정체성의 무대는 아니었다. 자산 중 3/4 정도가 부동산일 정도로, 집을 생활 공간보다 투자의 대상으로 더 크게 여겼던 한국인의 욕망에도 변화가 생겼다. 집을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담는 공간이라 인식하고, 인테리어와 가구에 공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건 과시와 자기만족이 결합한 욕망이다.
가구는 왜 욕망의 정점에 올랐을까?
욕망은 아직 갖지 못했지만 꼭 갖고 싶은 것이다. 2030세대의 욕망을 보여주는 ‘허세 피라미드’에서 1위는 가구, 2위는 인테리어, 3위는 집이다. 그 다음이 자동차, 시계, 골프, 명품 순이다. 외제차나 명품 가방보다 멋진 공간과 고가의 가구가 더 큰 과시와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집을 정체성의 무대로 삼는 2030세대가 늘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개성과 취향이 담긴 집은 그들에게 무엇보다 강력한 욕망이다. 이제는 타인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서 즐겁게 보내는 것이 중요해졌다. 과거 부자들만의 욕망이었던 집 꾸미기는 이제 보편적 욕망으로 확장됐다.
누군가의 집값보다 인테리어와 가구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어떤 소품을 두었는지가 더 큰 관심사가 되었다. 결국 일상을 풍요롭게 하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과거처럼 집 평수가 아닌 집을 채운 취향과 감각인 셈이다.
이제 Selfie가 아니라 Shelfie!
자기 모습을 스스로 찍는 행동을 ‘셀피(Selfie)’라 부른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모든 사람에게 셀피를 찍고 공유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쉘피(Shelfie)’가 대세다. 자신의 선반(shelf), 책장 속 책이나 물건들을 찍어서 공유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집의 공간과 물건을 드러내는 것인데, ‘#룸투어, #shelfie #온라인집들이’등이 소셜미디어에서 문화로 자리잡았다.

소비자의 관심을 드러낸다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보자. #집스타그램 589만개, #집순이 166만개, #온라인집들이 53만 2000개, #랜선집들이 30만 4000개, #shelfie 363만개, #룸투어 5만 3000개. 이렇듯 욕망은 수치로 드러난다.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자신의 공간을 드러내는 건 앞서 말했듯, 물건(가구, 소품)과 공간(인테리어)이 자신의 취향이자 정체성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아도 돈 들여 인테리어를 다시 바꾸고 입주한다. 옆집과 다른 자기만의 집으로 꾸미기 위해서다.
집순이 집돌이 전성시대
‘집순이’, ‘집돌이’라는 말이 부정적 꼬리표이던 때가 있었다.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외향적인 사람이 성공한 모습처럼 여겨졌고,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능력 없거나 사교성 없는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집순이, 집돌이는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태그가 되었고, 스스로 당당히 밝힌다.

(출처: 삼성전자 뉴스룸 USA)
집을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담은 공간으로 만들고, 그 속에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행위는 지금 시대에 맞은 새로운 성공의 모습이다. 개인주의가 보편화되고, 혼밥, 혼술, 혼영이 일상이 되고, 타인이 아닌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다. 나홀로 활동에 소비를 집중하는 ‘내향성 경제’, ‘내향성 소비’가 대세가 되고 있다.
사람들과 어울려 오프라인에서 하던 쇼핑과 모임이 온라인으로 옮겨오며, 집은 자연스럽게 소비의 무대가 되었다.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일상이 되면서, 이제 집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일하고, 쇼핑하고, 영화 보고, 휴식하는 복합 공간이 되었다. 집은 더 이상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장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무대이자 내면을 표현하는 브랜드 공간으로 변했다. 내가 좋아하는 가구와 향, 조명과 색감으로 채운 공간은 단순한 자기만족을 넘어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각 언어가 된 셈이다.
차경 그리고 집의 변화
우리 조상들은 ‘차경(借景, 자연 경관을 건축안으로 끌어들이는 전통 건축 기법)’이라 하여 집 밖의 산과 나무, 연못 같은 풍경을 창이나 마당을 통해 끌어들였다. 담 너머 보이는 산세를 집의 일부처럼 활용하거나, 창호 너머 연못 풍경을 그대로 액자처럼 담아내는 방식이다.

집 공간을 즐기고 꾸미는 이들이 늘면서 인테리어 시장에도 차경과 닮은 변화가 나타났다. 집 창문을 개방감 좋은 창호로 바꾸는 소비자가 많아진 것이다. 금속 난간을 유리 난간으로, 두꺼운 베젤을 최소화한 창호로 교체하며 집 바깥의 ‘뷰(view)’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 탁 트인 전망에 대한 욕망은 창호 시장을 바꾸고, 뷰가 좋은 집의 프리미엄을 더욱 높이고 있다.
과거에 ‘집에 있다’라는 말은 어둡고 폐쇄적인 골방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2025년의 집은 다르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꾸민 공간에서 남들과 소통하고, 안팎의 경계를 허물며 즐기는 확장된 무대가 되었다. 브랜드 역시 이 변화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집은 더 이상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취향과 개성이 드러나고 소비가 집중되는 핵심 라이프스타일의 무대이기 때문이다.
김용섭 트렌드 분석가 /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장
Trend Insight & Business Creativity를 연구하는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소장이자 트렌드 분석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정부기관에서 3000 회 이상의 강연과 워크숍을 수행했고, 트렌드 전문 유튜브 채널 ‘김용섭 INSIGHT’를 운영한다. 저서는 ‘라이프 트렌드 2026 : 인간증명 + 경험사치’, ‘라이프 트렌드 2025 : 조용한 사람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언컨택트’ 외 다수가 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Cheil Magazine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