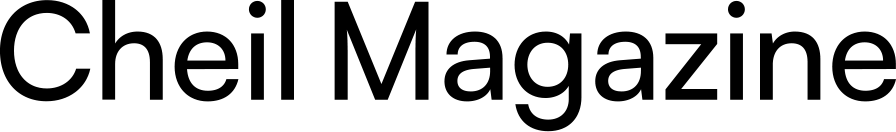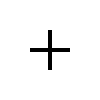제일기획 임연주 프로 (임연주 CD팀)
광고를 만든다고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 공들여 짠 카피, 커다란 촬영용 카메라와 스탭들, 다양한 앵글로 촬영한 장면들을 자르고 이어 붙인 편집본, 화려한 그래픽으로 채워진 후반작업, 멋진 BGM… 그런데 그 모든 게 없는 광고가 있다. 그리고 그 광고는 단번에 시선을 잡아챘다. ‘뤼튼’이다.
이상한 광고가 나타났다
뤼튼 광고는 시작부터 이상하다. 가로 화면이 아니라 세로다. 고정된 카메라가 아니라 손으로 들고 찍은 흔들리는 프레임이다. 지나가는 기차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웃음소리까지 그대로 들린다. 멋진 세트도 없다. G-DRAGON은 촬영장 간이 대기실에 앉아, 조명을 쓰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직접 셀프 촬영을 한다. 그러고는 그냥 카메라를 보며 말한다. “이거 AI 광고야. 광고야, 광고.”
그렇게 자세한 설명도 없이 뤼튼이라는 이름만 이야기한 뒤, 까만 화면에 거대한 빨간 글씨로 ‘뤼튼’ 두 글자만 보여주고 광고는 끝난다. 슬로건도 없고, 로고송도 없고, 기능 설명은 더더욱 없다. 그건 분명 광고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광고와도 달랐다.
왜 우리는 그렇게 이상해야 했는가
우리는 지금 AI가 너무 많아진 시대에 살고 있다. 어디에나 ‘AI’가 넘쳐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AI가 나와는 관계없는 무언가라고 생각한다. “나는 논문 안 쓰는데?”, “보고서 작성할 일도 없고…”, “이건 개발자나 쓰는 거 아냐?” 같은 거리감이 여전하다.
뤼튼은 이 벽을 깨고 싶었다. 논문 쓰는 AI, 보고서 만드는 AI가 아니라 내가 매일 부딪히는 고민과 질문, 흥미와 호기심에 바로 답해주는 생활밀착형 AI. 쓰면 쓸수록 나에게 맞춰지는 나만의 AI, 그래서 매일 쓰는 AI.
하지만 그런 메시지를 구구절절 ‘설명’해서는 절대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오히려 사람들의 감각을 건드려야 했다. 지금까지 봐온 AI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 이상한 광고. “이게 뭐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낯섦, 어딘가 이상한데 자꾸 생각나는 잔상, 기존 프레임으로 설명되지 않는 파격이 필요했다.
그 ‘크랙’을 만들어줄 얼굴로, 우리는 G-DRAGON을 떠올렸다. 완벽한 앨범과 공연, 아이코닉한 룩과 태도를 가진 아티스트이면서도, 늘 낯설고 독특한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해 온 인물. 익숙함과 낯섦의 경계에서, 그는 파격의 매개체가 되어줄 수 있었다.
“이래도 되나?”의 연속이었던 제작 과정
캠페인을 계획하고, 촬영을 하고, 영상을 완성해 가면서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래도 되나?”라는 의문이 오갔다. 과연 짜여진 카피 없이 촬영해도 괜찮을까? 그냥 이렇게 편집을 마무리해도 될까? 자막을 저렇게 덩그러니 둬도 되는 걸까? 엔딩의 로고를 저렇게 크게 넣어도 되는 걸까? BGM이 없이 괜찮을까? 사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정해진 계산에 맞춰 예쁘고 잘 만드는 일에 익숙했고, 우리 자신이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촬영 당일은 광고를 찍으러 가는 게 아니라,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가는 기분이었다. 독수리가 언제 날아오르고 톰슨가젤이 언제 뛰어들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을 담아야 했다. 철저한 계산과 연출 대신, 리얼함과 즉흥성으로 영상이 만들어졌다. G-DRAGON은 스스로 스마트폰을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움직이며 마치 일상 속에서 팬들과 소통하듯 리얼함 그대로를 보여주었다. 갑작스럽게 소소한 농담을 던지고, 노래를 부르고, 손짓을 하고,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모든 것이 편집 없이, 흐름 그대로 영상에 담겼다.
그 이상한 광고,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상했다. 이 광고는 좋아할 사람보다, “이게 뭐야?” 하고 당황할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그런데 그 당황스러움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호기심으로, 검색으로, 사용으로 이어졌다.
“G-DRAGON이 직접 찍었다고?”, “대체 이게 뭐야?”, “AI인데 무료라고?”
그렇게 캠페인 론칭 이후 몇 주 만에, 뤼튼의 일 평균 앱 설치는 57%, 회원가입은 44%나 증가했다.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간 것은 물론이고, 실사용 유저의 퍼널도 넓어졌다. 많은 사람이 뤼튼을 알게 되고, 실제로 사용해 보고, 꾸준히 이용하는 단계까지 도달한 유저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이래도 되는 광고, 그리고 그다음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광고를 봐왔다. 정교하게 계산된, 익숙하고 세련된 결과물들. 그래서 오히려 낯설게 등장한 이 거친 광고가, 새롭고 인상적으로 느껴졌던 건 아닐까. 클라이언트의 용기, 어카운트의 용기, 크리에이티브의 용기, 모두의 용기가 원기옥이 되어 만들어진 이 이상한 광고는 브랜드의 태도를 드러내는 전략적 선택이었고, 이제 뤼튼이라는 브랜드와 떼려아 뗄 수 없는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
다음 광고도 아마, “이래도 되나?”라는 말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된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